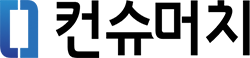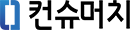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한 두 가지 측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라는 우리의 변호사 양성시스템이 대단히 까다로운 절차라는 점에서, 변호사에게 국가가 보증하는 평균적인 인텔리전스가 있음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각 사건분야마다 고유한 지식과 데이터베이스 및 독특한 소송 노하우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소송수행능력이 변호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측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 측면은 그 변호사의 성실성, 열정, 꼼꼼함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측면은 그 변호사의 개인적인 인품에 관한 것이어서 여기서 논하기 어려우므로, 아래에서는 소송수행능력의 측면에 관한 것만을 다루기로 한다.
대부분의 변호사 광고를 보면, 그 변호사 사진 아래 전문분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기업법무, 재건축/재개발, 언론, 금융, 보험 등’이라고 쓰고 있다.
즉 ‘저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게재된 다른 변호사도 또한 ‘민사, 형사, 행정, 기업법무, 재건축/재개발, 언론, 금융, 보험...’이라고 자신의 분야를 밝힌다.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쇼핑의 첫 번째 이유가 ‘변호사라는 상품’의 퀄리티를 균일하다고 본 것에 있다는 지적은, 변호사들의 비합리적인 광고와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
즉 양자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변호사라는 상품’이 결코 균질하지 않음에도 균질한 것처럼 의제된 현실은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 소비’를 가로막고, 공급자로 하여금 ‘합리적 광고’를 저해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공시제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다만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을 단번에 베어 버렸던 ’알렉산더의 칼‘처럼, 전문분야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가장 단적으로 카테고리가 지니는 추상성과 아카데믹함 때문이다. ’전문분야‘는 사건에 닥친 소비자로 하여금,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명시적인 기준을 줄 수 있어야 함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분류를 ’학문적 분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변호사의 독자적인 소송수행능력의 측면을 광고하는 것과 그러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선택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다.
즉 소비자가 ‘변호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변호사가 ‘자신을 어떻게 광고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같다.
요컨대 어떤 변호사의 전문분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검색’으로써 쉽게 접근할 수 있는(easy approachable)그런 키워드이어야 한다. 나아가 그 카테고리는 ‘고정된 도그마’이어서는 안 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 더해지고 바뀔 수 있는 ‘살아 있는 분류’이어야 한다.
‘전관(前官)경력’에 대한 예우로 재판의 승패가 바뀐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막 옷 벗은(?)’ ‘전관 출신 변호사’가 그러한 경력을 가지지 않은 변호사와 속칭 ‘약발(?)이 떨어졌다’는 은어가 붙은 ‘은퇴한지 오래된 전관 변호사’를 사건수임에 있어서 압도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장왜곡이 바로 잡히려면, 그러한 전관출신 변호사가 고액의 수임료에 비하여 특별한 질적 차별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변호사의 어떤 경력이 소비자들에게 공시되어야 하는가?
사법연수원 몇 기이고, 어떤 법원, 어떤 검찰청에서 근무했으며,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건을 담당한 판사나 검사와 절친하다는 그런 경력이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력이 무엇인가? 해당사건에 대한 학위, 논문, 연수경력, 관련 기관 근무경력, 승소판례 등이 유력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될 수 있어야 한다.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세민, 글 출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 법제연구(2012년 11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