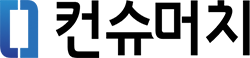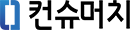혼자 사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고용 변환 더 취약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정규직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될 경우, 우울증 위험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소희 교수팀이 정부의 한국복지패널조사(2008∼2011년)에 응한 7368명을 대상으로 고용상태 변화와 우울증의 상관성을 살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학저널’(BMJ) 최근호에 소개됐다.
박 교수팀은 정규직 지위를 계속 유지(정규직→정규직)하고 있는 직장인의 우울증 발생 위험을 기준으로 해 고용 형태의 변화가 우울증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했다.
정년 퇴직ㆍ해고 등 정규직에서 실업으로 바뀐 사람의 우울증 발생 위험이 1.78배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비정규직→실업(1.65배), 비정규직→비정규직(1.54배), 정규직→비정규직(1.46배), 실업→비정규직(1.34배) 순서였다.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정규직, 실업→정규직으로 바뀐 사람의 우울증 위험은 정규직 유지한 사람과 차이가 없었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비정규직(precarious employment)은 특정 기간 내에 회사를 떠나기로 돼 있는 상태, 즉 임시직ㆍ파트타임ㆍ간접고용 등을 가리킨다”며 “(이번 연구에선) 구직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직업이 없으면 모두 실업(unemployment)으로 간주했다”고 기술했다.
이 연구에선 또 성(性)ㆍ거주 지역ㆍ교육 수준ㆍ결혼 여부ㆍ경제적 능력ㆍ가구주 여부ㆍ자신이 평가하는 건강 상태 등이 고용 형태 변환 뒤의 우울증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
| ▲ (사진출처=pixabay) | ||
고용 형태가 바뀐 뒤의 우울증 발생 위험은 여성이 남성의 1.83배였다. 이는 여성이 심리적으로 더 예민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 대도시에 살수록(서울 시민이 농촌 지역 거주자의 1.29배), 학력이 낮을수록(초등 학력자가 대졸자의 1.25배), 홀로 살수록(기혼 대비 사별 1.71배, 이혼 1.31배, 독신 1.28배), 소득이 낮을수록(소득 수준을 4단계로 나눴을 때 최하위가 최상위 계층의 2.24배) 고용 형태 변환 뒤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했다.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현재 흡연자의 고용 형태 변환 뒤 우울증 위험은 ‘매우 건강하다’는 여기는 사람과 비(非)흡연자 대비 각각 3.6배ㆍ1.37배 높았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비(非)가구주 여성의 우울증 위험은 고용 형태의 변화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잦은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 기인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고학력ㆍ고숙련 여성이라도 결혼ㆍ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국내 여성 고용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란 것이다.
남성은 가구주(가계의 주 수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 형태의 변화가 우울증 위험을 높였다.
비(非)가구주 남성도 고용 형태가 실업→비정규직, 실업→정규직으로 바뀌자 우울증 위험이 각각 2.65배ㆍ2.25배(정규직 유지 대비) 높아졌다. 정규직 가구주 남성이 ‘백수’가 된 뒤의 우울증 위험은 2.56배(정규직 유지 남성 대비)였다.
여성 가구주는 고용 형태 변화에 따른 심리ㆍ정신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여성 가구주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에서 ‘백조’(실업)로 바뀌었을 때의 우울증 위험은 3.1배로, 남녀를 통틀어 최고였다.
박 교수팀은 논문에서 “비정규직ㆍ실업이 우울증과 연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고용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성(性)ㆍ가구주 여부를 고려할 필요한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