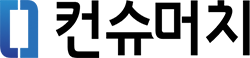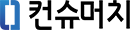[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이랜드는 1980년에 패션사업을 시작해 35년 넘게 이어오면서 현재 150개 브랜드와 1만3,0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패션 매출규모 1위 기업이면서, 자산규모만 7조5,310억 원에 이르는 패션업계의 대표적인 기업이다(2013년부터 대기업집단이었다가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이랜드가 끊임없는 디자인 도용·표절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른바 ‘짝퉁’은 고가의 명품이나 대형 패션 브랜드의 제품 디자인을 저급한 재료와 저품질로 흉내내 만든 모조품을 가리킨다.
패션계에서 국내를 대표할 만한 이랜드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면 당연히 표절을 당하는 쪽이여야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랜드가 중소기업이나 개별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최근 이랜드의 SPA브랜드 스파오의 맨투맨 티셔츠가 지난 2014년 ‘유아인 티셔츠’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노앙(NOHANT)’의 러브시티 시리즈 맨투맨과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앙’의 레터링 디자인은 한글과 영문 절묘하게 섞어 쓰는 것이 핵심인데 스파오의 티셔츠는 이를 쏙 빼닮았다. 패션을 전혀 모르는 기자 눈에도 레터링 방식이 유사하다고 보일 정도다.
이랜드는 이 제품을 한글날을 기념해 기획했고, 수익금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이랜드는 좋은 일 하려다 매를 사서 맞은 꼴이 됐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번 표절 논란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의류 브랜드 ‘미쏘’, 리빙 브랜드 ‘버터’, 신발 편집숍 ‘폴더’ 등 이랜드의 브랜드 중 일부가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도용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 논란은 단순히 의혹 수준을 넘어서 김연배 이랜드 대표가 디자인 도용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청 국정감사까지 참석하는 상황까지 진행됐다.
물론 이번 티셔츠 논란의 경우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 신뢰이며, 브랜드 이미지다.
불과 1년만에 이랜드는 다시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만 그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디자이너로 바뀌었을 뿐이다. 창피한 일인 것은 매한가지다.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 안타깝다.
이번 일로 이랜드는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짝퉁 만드는 이랜드’, ‘중소기업 디자인 뺏는 이랜드’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