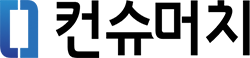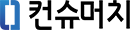펫보험 들까 말까⑧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애완견과 반려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애완견은 한자어로 사랑 ‘애(愛)’, 희롱할 ‘완(玩)’, 개 ‘견(犬)’의 뜻을 갖고 있다. 특히 희롱할 ‘완(玩)’은 장난감을 뜻하는 ‘완구(玩具)’와 같은 자(字)를 쓴다.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 존중하기 보다는 인간이 애정을 주며 가지고 노는 소유물로 바라보는 경향이 컸던 시대상이 반영된 단어다.
이제는 우리사회 인식이 개선되면서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지칭하는 단어도 자연스럽게 ‘반려견’, ‘반려동물’로 대체됐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개념으로 지위가 격상된 것이다.
실제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게 쓰던 ‘애완견’, ‘애완동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거북하게 느껴지는 건 그만큼 동물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달라졌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국내 인구 1000만 시대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가 육아용품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니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성장이 더딘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있다. 바로 ‘보험’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공감할 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진료비 문제다.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사람이 병원비 부담을 보험으로 대비하듯 반려동물도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보험 가입률이 약 0.3% 정도에 불과하다. 엄마, 아빠, 자녀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가족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은 들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반려인들의 구미를 끄는 매력적인 보험 상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달에 대략 3만~4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해도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중성화수술, 임신 및 출산, 피부질환 등 수요가 많은 항목은 보장이 안 돼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적금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한다.
물론 보험사도 할 말은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개체 식별과 연령 구분이 어려운데다 진료수가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보니 손해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상품개발을 꺼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최근 보험사들이 먼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펫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마티즈나 푸들 등 소형견의 90%가 겪는 질환인 슬관절 질환이나 구강 질환에 대한 보장 내용은 늘리는 등 지난해 메리츠화재를 시작으로 달라진 펫보험을 상품을 하나 둘 출시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100%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아니나 반려견 보험뿐 아니라 반려묘 보험까지 출시될 정도로 보험상품 질과 양이 전에 없이 발전하는 중이다.
이제 반려인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씩 화답할 때다. 손해율을 낮추는 동시에 더 많은 반려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사도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일단 '펫보험은 불필요하다'고 지레 체념하기보다 새로운 펫보험 상품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미흡한 부분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다.
더불어 손해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자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키우는 반려견 중 한 마리만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품종의 다른 반려견 의료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펫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손해율이 올라가면 펫보험 상품 개발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펫보험의 울타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다른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돌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