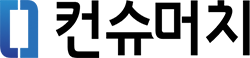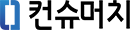| ||
[컨슈머치 = 박지현 기자] CGV가 관람료 다양화 정책을 지난 3일 시행했다. 관람료는 좌석에 따라, 상영 시간대에 따라 세분화됐다.
소비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저녁시간(16~22시)은 '프라임'시간대로 분류됐고, 관람이 편한 상영관 뒷쪽 좌석은 '프라임존'으로 불리게 됐다. 소비자들이 이 '프라임'이 들어간 시간대와 좌석에 앉으려면 기존보다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
CGV는 가격 다양화 정책을 펼치며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는데 그들이 제시한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를 살펴보자.
직장인이 평일 퇴근 후 문라이트 시간대(22~24시)에 이코노미존(스크린과 가장 가까운 좌석)을 선택한다. 이 때 관람료는 7,000원에 불과해 오히려 가격 인하효과가 있다.
이것이 CGV가 보여준 예시다. 과연 잘 반영된 것일까.
일단 '보통의 직장인'은 평일 퇴근 후 밤 10시에 영화를 관람할 여유가 없다. 설사 '보통의 직장인'이 영화를 보더라도 굳이 앞 좌석(이코노미존)에서 2시간 가량을 고개를 쳐들고 관람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좋은 좌석을 선택하는데 대한 기회비용이 1,000~2,000원에 불과하다면 더욱 그렇다.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평일 퇴근 후 영화관람료가 저렴해지는 대신 주말·저녁시간 편한 좌석의 관람료는 오른다면 어떤 소비자가 달갑게 받아들이겠는가.
현재 CGV의 가격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마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이나 해)’처럼 느껴진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사실상 하나(프라임존/프라임시간)로 정해두고 의견을 묻는 척 하기 때문이다.
또 CGV 측은 ‘가격 다양화’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미국의 멀티플렉스인 AMC에서는 지난해 개봉한 <스타워즈>를 좋은 자리에서 보기 위해 소비자들이 영화관 앞에서 줄을 길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AMC는 예매 시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선착순으로 앉고 싶은 자리에 앉게 돼 있다. 이는 캐나다, 영국의 일부 멀티플렉스도 마찬가지다.
좌석 미지정 제도가 더 낫다고 할 수도 없지만 가격 다양화 정책을 '세계적 추세'라는 말로 단정지을 수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CGV는 업계 1위(시장 점유율 41%)인만큼 그 파급력이 크다.
CGV의 결정이 국내 모든 영화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롯데시네마까지 ‘가격 다양화’ 정책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CGV가 가격 제도를 계속해서 손 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가 결코 달가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영화관에 관객이 줄면 단순히 CGV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짐을 함께 지게 된다.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영화 산업의 생태계를 굳건히 하는 기업, 고객들에게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는 기업이 되고 싶다는 CGV. 하지만 CGV의 요즘 행보를 보면 영화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