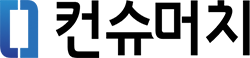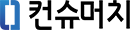| ||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올 한 해 동안 병원에 갔던 날을 대충 세어 보면 많아야 한 두 번 남짓이다.
심하게 감기를 앓거나, 갑작스러운 복통 생길 경우, 그것도 아니면 출근길을 서두르다 계단에서 발목을 삐끗하는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야 겨우 병원을 찾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병원비가 1만 원을 넘는 일은 거의 없다.
병원에 가는 횟수도 적고, 가더라도 진료비가 1만 원선을 넘지 않다 보니 돌아보면 아직은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전혀 보지 않고 넘기는 해가 더 많다.
그럼에도 실손보험의 해약을 생각한 적은 기필코 단 한 번도 없다.
야금야금 오르는 보험료 청구서를 보면 한 숨이 나오지만, 혹시 일어날지 모를 커다란 사고 혹은 나이가 들어 병원에 갈 일이 잦아질 먼 훗날을 대비해야 하는 게 진정한 ‘보험’의 의미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아직 병원비 지출이 크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실손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돼 버렸다. 가입자 수 3,2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2가 ‘실손보험’이라는 우산 안에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 등을 보장해 주는 실손보험은 명실상부 ‘제2의 국민건강보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실손보험’의 향후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일부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병원들의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만약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수년 내 실손보험 상품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중이다.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고 치료용으로 둔갑시키거나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반복하는 일이 보험사기라고 자각하지 못할 만큼 만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만 오르고 있다.
속칭 ‘나이롱 환자’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진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 상승 유발뿐 아니라 보장 범위까지 축소되는 실정이다. 올해 하지정맥류 레이저 및 고주파 치료 시술 보장이 빠진 데 이어 도수치료·백내장수술 등으로 제한되는 질환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실손보험의 보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째서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소수의 불량 가입자들, 혹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병원들로 인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일까?
이쯤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자면, 보험의 정의는 이렇다.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해 두고, 재난을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써 개개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호부조’ 성격의 경제제도.
보험은 개인 혼자만의 울타리가 아니다.
한 사람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다른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이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