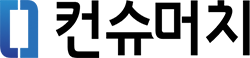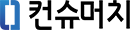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공산품,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 리콜 실적을 종합했다.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2021년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 실적(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제품의 확대 및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의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명령은 2020년 1241건에서 2021년 1678건, 자진리콜은 2020년 699건에서 2021년 1306건, 리콜권고는 202년 273건에서 2021년 486건으로 모두 증가했다.
리콜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했다.
이중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20년 407건 대비 2021년에 911건으로 2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가정, 사무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9개 화학제품의 관리대상이 2020년 10만5874개에서 2021년 20만7087개로 95%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확대되고,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3개월에서 1개월)해 점검 횟수를 강화함에 따라 2배 이상 건수가 증가(222건→461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리콜 건수는 공산품이 2020년 916건에서 2021년 1719건, 한약재·의약외품을 포함한 의약품은 2020년 223건에서 2021년 807건, 자동차는 2020년 258건에서 2021년에 314건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공산품 중 화학제품류(916건)는 방향·탈취제품 26.85%에 이어 캔들제품이 23.25%, 세정제품 11.13% 순으로 대부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됐다.
의약품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의 검출 및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전년(223건) 대비 4배 가까이 건수가 증가했다.
‘의약품 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 체계 구축했다.
수거·회수명령의 집행 및 보고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리콜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1건 증가한 총 78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원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이 경기, 서울이 포함돼 전국적으로 리콜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정위는 "리콜 건수 증가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각 정부 부처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리콜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 "소비자, 베타테스터 아니다" 차량 결함 신고 2년새 급증
- 하베브릭스 그리프 치발기 리콜…'녹물' 발생 가능성
- BMW X6, 전면 그릴 등화 제작결함…7433대 리콜
- 벤츠 EQA 250 1077대 리콜…'에어백 컨트롤 유닛' 결함
- 토요타 시에나 1789대 리콜…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 결함
- 분양 아파트 설계변경 후 불만…'장식장·계단손잡이' 설치 요구
- 인터넷서비스 해지했는데…알고보니 2년간 매월 요금 인출
- 얼굴 지방이식 후 지방종 발생…의사 "시술, 문제 없어"
- 오라이트 손전등 2종, 화상 가능성 리콜
- 네슬레 코코아 분말 '실리카겔' 혼입 가능성…국내 유통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