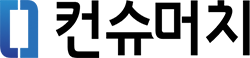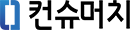한 소비자가 문 앞에 놓인 택배상자가 분실돼 판매자와 택배사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모두 책임을 부인했다.
A씨는 명품거래 오픈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까르띠에 손목시계를 449만9000원에 구입했다.
판매자로부터 배송 의뢰를 받은 택배사는 제품 배송을 위해 A씨 자택을 방문했으나 A씨가 부재해 문 앞에 상자를 뒀다.
자택에 돌아온 A씨는 배송 완료된 제품이 분실된 사실을 알고 황당해했다.
A씨는 택배기사에게 제품을 소화전 내부에 놓고 가라고 했으나 문 앞에 놔 분실이 일어난 것으로, 자신의 과실 없이 상품을 인도받지 못했으므로 판매자와 택배사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고가의 상품 구매한 후 본인에게 안전하게 인도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 A씨가 직접 수령하거나 경비실, 무인택배함 등 안전한 장소에 위탁하도록 하지 않아 제품이 분실됐으므로 판매자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사는 배송 당일에 두 차례 A씨와 통화해 수취 장소에 대해 물어봤고, A씨가 문 앞에 두고 갈 것을 요청해 제품을 문 앞에 둔 것이므로, 이 후 발생한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와 택배사, A씨 각각 분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택배사는 물건에 대한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상법」제125조에 따른 운송인이며, 「동 법」제135조에 따르면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파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는 택배사와 계약을 한 당사자는 아니나, 「상법」제140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A씨는 택배사에 제품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택배기사는 운송계약이 안심소포 서비스임을 인지하고 배송 전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A씨가 부재중이라 소화전 내부에 놓겠다고 했으나 A씨가 문 앞에 놔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A씨는 소화전 내부에 놔달라고 했는데 택배기사가 문 앞에 놔 분실됐다고 하는 등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등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택배기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나,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택배사는 제품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 살펴보면, 「상법」제137조 제1항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송약관의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서는 ‘망실·훼손시 50만 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 단, 보험취급한 경우 신고가액 300만 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안심소포에 해당해 최대 300만 원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나, 판매자가 택배사와 계약 체결 시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200만 원이라고 기재했으므로 택배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200만 원으로 제한한다.
한편, 판매자는 A씨와 제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으로서 「민법」제568조에 따라 제품을 A씨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제품이 인도되는 과정에서 택배사의 과실로 제품이 멸실됐으므로 판매자는 「민법」제390조, 제391조에 따라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수령인인 A씨 역시 제품의 수령을 위해 운송인에게 협조해야 하며, 소화전이나 문 앞에 두고 갈 경우 분실을 우려해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므로 A씨 책임을 일부 인정해 판매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품 구매대금의 약 80%인 36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하면, 판매자는 A씨에게 360만 원을 지급하고, 택배사는 이 중 200만 원에 대해 판매자와 공동해 책임을 부담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 등산스틱 제조사, A/S 후 항공택배 착불 배송
- 컴퓨터 택배 배송 중 파손 "수리 불가능할 정도"
- 밥솥, 택배사 과실로 찌그러져…잔존가치 배상가능
- 택배 보낸 복숭아 '긁히고 눌리고 부패까지'
- 택배상자 개봉 이유로 교재 반품 거절
- 선물 받은 전기압력밥솥, 뒤늦게 오배송 인지
- 침대 택배 배송중 파손…업체 "포장 잘못됐다" 소비자 탓
- 반품 신청 후 택배사 과실로 상품 분실
- "주문 제품, 재고 없다" 일방적 계약 취소
- 느리게 가는 시계…제조사 "이상없다" 택배비 요구
- 해외직구 파손 보장 보험 가입…배송대행업체 "적용 불가" 주장
- 반품 송장 발급 오류, 물품 분실…책임 공방
- 명품 구매대행 '에스디컬렉션' 소비자 피해주의보
- 택배운송 의뢰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무인매장, 육회·밀키트·과자 위생관리 불량